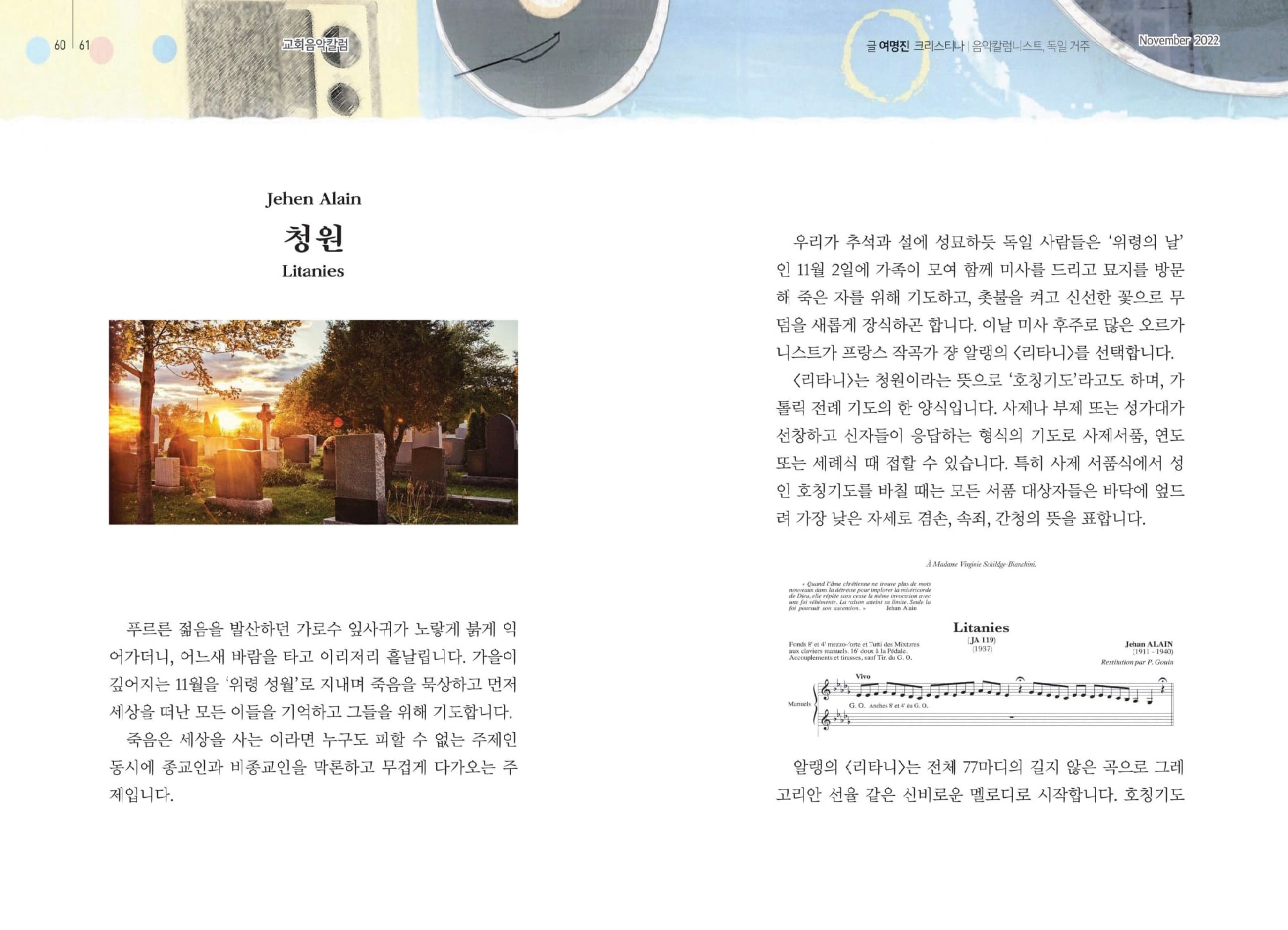성가SUNGGA
전례음악자료실
| 제목 | [교회음악 칼럼] 청원 | |||
|---|---|---|---|---|
작성자크리스티나

|
작성일2022-11-14 | 조회수1,051 | 추천수0 | |
|
월간 <빛> 교회음악칼럼 2022.11 https://www.lightzine.co.kr/magazine.html?p=v&num=4707
Jehen Alain 청 원 Litanies
푸르른 젊음을 발산하던 가로수 잎사귀가 노랗게 붉게 익어가더니, 어느새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흩날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11월을 ‘위령성월’로 지내며 죽음을 묵상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은 세상을 사는 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인 동시에, 종교인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추석과 설에 성묘하듯, 독일 사람들은 ‘위령의 날’인 11월 2일에 가족이 모여 함께 미사를 드리고 묘지를 방문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촛불을 켜고 신선한 꽃으로 무덤을 새롭게 장식하곤 합니다. 이날 미사 후주로 많은 오르가니스트가 프랑스 작곡가 쟝 알랭의 <리타니>를 선택합니다. ‘리타니’는 청원이라는 뜻으로 ‘호칭기도’라고도 하며, 가톨릭 전례 기도의 한 양식입니다. 사제나 부제 또는 성가대가 선창하고 신자들이 응답하는 형식의 기도로 사제서품, 연도 또는 세례식 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제 서품식에서 성인 호칭기도를 바칠 때는 모든 서품 대상자들은 바닥에 엎드려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 속죄, 간청의 뜻을 표합니다.
알랭의 <리타니>는 전체 77마디의 길지 않은 곡으로 그레고리안 선율 같은 신비로운 멜로디로 시작합니다. 호칭기도에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듯 이 주제선율은 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며 다양한 리듬, 다양한 셈여림, 다양한 속도로 변주됩니다. 때로는 읊조리며,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절규하며 반복되는 선율은 우리 삶의 다양한 기도를 담아냅니다. <리타니>를 작곡할 당시 작곡가 알랭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유산했고, 본인 스스로는 늘 악몽에 시달렸으며 여동생은 산악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악보 귀퉁이에 쓰인 메모는 알랭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견디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Quand l'âme chrétienne ne trouve plus de mots nouveaux dans la détresse pour implorer la miséricorde de Dieu, elle répète sans cesse la même invocation avec une foi véhémente. La raison atteint sa limite. Seule la foi poursuit son ascension.“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고통에 잠겨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어떠한 말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혼은 간절히 같은 청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성은 한계에 이르고, 오직 믿음만이 하늘에 닿습니다.
쟝 알랭은 또 다른 여동생인 오르가니스트 마리 끌레르 알랭에게 <리타니>를 연주할 때 “불길에 휘감기는 듯한 감정으로 연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도는 불평이 아니라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뒤엎는 저항할 수 없는 돌풍이야. 강한 집념. 이 집념으로 사람들과 하느님의 귀를 채워줘. 흐트러져도 좋으니 네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휘몰아쳐!”
알랭은 1935년 결혼하여 세 아이를 둔 젊은 아버지였지만 1939년 세계 2차대전에 소집되었고, 1940년 6월 20일, 콩피에뉴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이틀 전에 소뮈르 근처에서 29살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 알랭, 세상에 기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또 어느 누군가. 누군가의 가족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사랑을 듬뿍 받다가 떠나간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세상에 남겨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묵상해 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