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강길웅 신부의 소록에서 온 편지
4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다
등산은 혼자 다녀야 산에 대한 음미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누군가
쓸데없는 잡담을 걸어 온다든지 혹은 동행이 있어 걸음의 템포를
맞추기 위해 괜한 신경을 쓰다 보면 심신이 그만큼 피곤하게 된다.
산에서는 역시 산보다 더 다정한 친구도 없다.
산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다. 그리고 산은 어떤 옷이라 해도
그 몸에 항상 잘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산이라 해도 오를
때마다 맛이 다르며 찾을 때마다 그 운치가 다르게 된다. 비가 올
땐 비가 와서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산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사범학교 시절에는 무던히도 산을 좋아했었다. 그때는 가정적으
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풍파가 삶을 온통 혼란에 빠뜨렸던 어
지러운 시기였다. 바로 그런 때, 물론 지금도 가끔 그렇지만, 어려
운 때에 나를 정답게 받아 줄 대상은 하느님과 산밖에 없었다. 하
느님과 산은 공통점이 있었으니 이를테면, 오를 때는 몸이 무거워
도 내려올 땐 마음이 가벼웠다!
어느 날이었다. 그 날은 오후 늦게 대전의 보문산에 올라갔다가
한밤중에 미친놈처럼 혼자 내려오는데 보문사라는 절을 지나서였
다. 어떤 소복 차림의 여자가 내 뒤를 밟는데 아무래도 뭔가 수상
했다. 내가 걸음을 멈추면 거기서도 멈췄고 내가 잰걸음으로 걸으
면 그쪽에서도 역시 빠른 걸음으로 쫓아왔다. 별일이었다.
누굴까? 귀신 얘기가 갑자기 머리를 스쳤지만 그러나 두렵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산허리를 돌아 내리
막길이 나왔을 때 얼른 몸을 숨겼더니 흰옷이 바로 그 자리에서 멈
칫하더니만 아래로 달려가더니 저 아래 쪽에서 "악" 하고 넘어지
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내가 뛰어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젊은 부인이었다. 혼
자 절에 다녀오는 길에 너무 무서워서 내 뒤를 따라왔던 것인데 내
가 없어지자 겁이 덜컥 나서 얼른 뒤쫓아오다가 넘어졌다는 것이
었다. 나는 그때 달빛도 없는 한밤중에 만난 그녀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산에서 만난 사람은 장소가 산이라서 그런지 간혹 이쪽에서 애절
한 느낌을 갖게 된다. 물론 일방적인 생각이겠지만, 저쪽도 삶의
어떤 여정에서 고달픔이 있는가 싶어 오히려 더 슬픈 것은 내 과거
가 그랬고 또 내 현실이 그 수준에서 맴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장흥에 있는 천관산에서의 일이다. 천관산은 산이 마치
관을 쓴 것처럼 웅장하게 생긴 바위들이 정상에 우뚝 솟구쳐 있는
모습도 장관이지만 산을 오를 때에 만나는 크고 작은 바위들도 신
기한 모습들이 많아 작은 월출산을 방불케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상에서였다.
혼자서 바위 위에 앉아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뒤쪽에 이상한 느
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 언제 왔는지 웬
젊은 부인이 보따리를 머리에 인 채 아이를 걸리면서 나를 바라보
고 있었다. 등산객도 아닌 자가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여자가 관산읍에 가는 길을 물었다. 실은 나도 하산 길을 그쪽으
로 잡아야 했기에 동행을 했는데 길이 험해서 아이를 걸릴 수가 없
었다. 그래서 아이는 내가 업고 여인은 보따리를 이고 산에서 함께
내려오는데 기분이 좀 묘했다. 이게 도대체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
는 일인지 분간을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우리는 내려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고 싶은 것도 없었
고 하고 싶은 얘기도 없었다. 한 시간을 함께 내려오면서도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왠지 여인의 입장이 자꾸 측은하게 느껴져
아이를 업으면서도 무겁지가 않았다. 그리고 읍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였다.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한 여인이 달려오더니 그 자매와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마침 광주행 버스가 오는 바람에 얼른 차에
올랐는데 울면서 손을 흔들던 그 자매도 영 잊혀지질 않는다. 산다
는 게 뭔가. 곳곳에서 펼쳐지는 삶의 고달픈 모습들을 보노라면 슬
픈 마음이 마냥 내 쪽에서 더 크게 된다.
지난 여름이었다. 도시에서 사는 자녀 내외가 소록도에 홀로 계
신 아버지를 뵙고 떠나는 모양인데 서로 붙잡고 우는 모습에서 많
은 이들이 눈시울을 적시게 되었다. 이쪽은 무엇이고 저쪽은 또 무
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갈라 놓는 것인가.
누군가 말했단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思考)의 능력
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절실하게 요
청되는 것이 바로 슬픔이나 가난이나 병 같은 아픔이라고 한다. 다
시 말해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인간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된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산' 을 넘고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산 타는 사람들은 과연 '산' 을 넘고 있는가.
아픔을 모르는 이에겐, 산은 '산' 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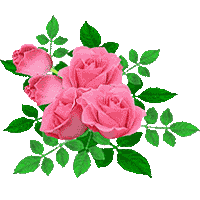 주님의 평화가 항시 함께 하기를......
주님의 평화가 항시 함께 하기를......

 신고
신고

 신고
신고